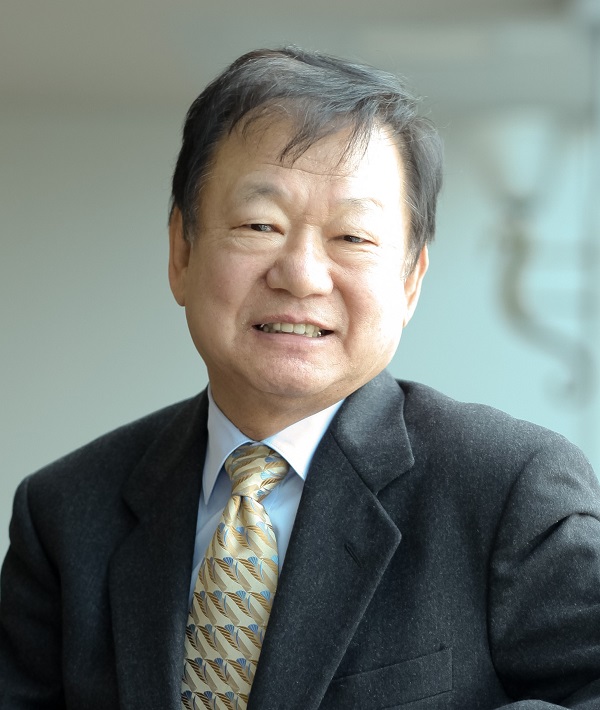
[nbn시사경제] 탁계석 비평가회장
한국 노래의 정체성 찾아야 할 때
21세기 들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타국과의 문화적 교류라는 예술 본연의 기능이 활발해 지고 있음을 체험하면서 생각 있는 우리 작곡가들과 성악가들은 문제에 봉착한다. 교류라는 것은 내 것과 다른 이의 그것이 서로 만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성악인 들이 우리 노래를 유럽이나 여타 외국인 앞에서 부르고 나면 그들로부터 “지금 그 곡이 한국예술가곡 맞느냐‘ 는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 이탈리아 가곡 같다고 한단다. 네 노래는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저들 보기에 나의 노래는 없다는 것인가?
예술은 자아의 발로이며 나의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국적 노래란 무엇이냐는 문제의식이 자연히 생겨나는 것이다. 이 시점에 기량 있고 사려 깊은 젊은 성악인들 스스로가 우리 노래의 정체성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개척의 길에 나섬을 보는 것은 기쁨과 함께 감사함이려니와 이미 오래전 이런 선각자적인 생각해온 선배들이 여러 형태의 단체와 조직을 통하여 노력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국적 가곡의 양적인 질적인 문제를 제쳐 놓고서라도 한국 시(詩)를 가지고 외국인 아닌 한국인 성악가가 우리말로 우리 노래를 부르는 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원망을 들어 온 지 이미 오래다. 성악계의 크나큰 숙제이며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다음 과제이다.
작곡가의 입장에서 보면 노래는 시를 선율로 읊는 것이며 결코 선율에다 시를 끼워 넣은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예술가곡이라면 그것은 시에 의해, 시에 바탕 하여 시 때문에 그러한 선율이 생긴 것이며 이에 따라 화성과 반주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발성된 멋진 소리를 만들기 위해, 크고 높은 소리를 위해 시(詩)라는 그 가사를 희생시킬 수 없으며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해야 진정한 우리 예술가곡이 될 수 있다. 난제일 것이다.
이는 교육에 의해서만 발전하고 성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미 이일을 직시하고 극복한 모범적인 성악가들을 통해 큰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계파와 파벌을 초월한 본격적인 워크숍, 세미나 그 밖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정면 돌파에 나서야 한다.
가곡을 사랑하는 모임도 많고 행사도 자주 열린다. 가곡을 사랑하는 우리 청중들은 다 같이 부르는 소위 관현악 반주에 의한 가곡 떼창에 익숙하다. 여리고 얕은 노래이기에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그러나 예술가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슈베르트의 가곡, 슈만의 가곡이 아름답고 좋다고 그것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서 다 같이 부르는 일은 없다.
피아노 한 대의 반주지만 시의 깊이와 어우러지는 담백한 선율과 깊은 화성, 시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반주의 음형 뒷받침 위에 고결한 인성을 통하여 감상할 뿐이다. 값싼 감상주의와 자연발생적인 그런 노래는 이제 충분하다. 더욱 진지하고 사색적인 한국적 예술가곡이 다음 단계의 과제로 필요하다. 작곡가와 시인과의 연계 또한 필요에 따라 필연 적으로 대두된다.
우리 가곡을 부른 성악가들에게 외국인들이 “그 곡이 한국예술가곡 맞느냐‘ 는 질문을 받는 것은 작곡가들의 책임이다. 성악가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급스러운 우리 예술가곡을 써내야 한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해야 한다. 작곡가들이 꼭 한국적인 가곡만을 쓸 이유도 없고 꼭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쓸 수는 있어야 한다.
다양한 기법 활용 우리 것 담아 내야
이상(李箱 1910-1937) 이나 윤동주(尹東柱 1917-1945)의 시에 세마치장단의 덩더기 덩더궁의 노랫가락을 꼭 부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탈리아 가곡과 독일 리트 그리고 프랑스 샹송, 러시아 가곡 사이에서 한국예술가곡은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 가는 작곡가라면 고민해야 하며 답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습작과 모작에 그치며 그들의 종속 문화로 전락한다.
이러한 생각은 좁은 민족주의나 국수주의가 아니다. 노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언어와 글이 있다. 노래는 우리 고유의 언어와의 결합이다. 시대성에 따라 융합을 이루어는 왔지만 사라지지 않았으며 도태되지도 않는다.
국악 가곡의 보전과 함께 시대를 달리하며 발전하여온 서양음악의 다양한 기법안에 성악이나 작곡 모두 그것을 그릇 삼아 그 안에 나를, 우리 그것을 담아야 한다. 서양음악의 기법은 이제 지구촌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곡을 우리 성악가들이 가사를 전달력 있게 부를 때 나와 우리 스스로가 정립되며 작곡가와 성악가 그리고 가곡 애호가들이 보는 우리 예술가곡의 다음 과제에 대한 답이 되리라 생각한다.
nbn 시사경제, nbnbiz


